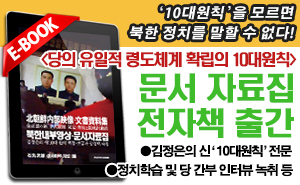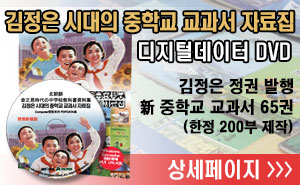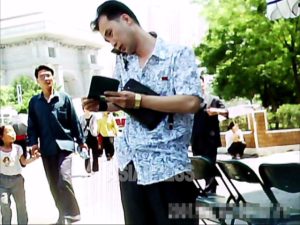◆농지의 국가 소유 전환은 법률에도 명시
또한 최근의 법률 개정에도, 농지 국유화 전환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선 북한헌법(2023년 9월 개정) 제23조를 보자.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중략)…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전인민적 소유는 국가 소유를 뜻하는 북한식 표현이다.
또한 토지법(2022년 5월 개정본) 1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협동단체소유토지는 협동 경리(경영)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또한 농업법(2020년 9월 개정본) 4조는 ‘국가는 국영경리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며 협동 경리를 성숙된 조건과 가능성,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점차 국영 경리로 전환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협동농장은 북한이 추구하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농업협동화의 경위
1946년 3월, 5정보(약 5ha) 이상의 사유농지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 아래 토지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로 인해 소수의 지주가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농민 개인에게 분배되었다.
이후 농민 소유였던 대부분의 농지는 1958년 농업협동화가 완성되면서 농업조합의 협동적 소유로 전환되었다. 이후 1962년 조합이 리단위의 협동농장으로 개편되면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토지는 농민들의 집단적 소유로 남아있었다.
◆농지 국유화라면 정책 대전환
전국의 협동농장이 국영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그 땅의 소유권은 국가로 완전 귀속된 것이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이후 처음으로, 농지가 협동적 소유에서 국가 소유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간과할 수 없는 큰 변화이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여온 김정은 정권의 장기적인 국가운영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한 바, 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아프레스는 함경북도 이외에서도 농장의 명칭 변화가 있었는지 현시점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 <북한내부>올해의 '퇴비전투' = 인분 쟁탈전 치열 할당량 초과에 이례적 포상 금품, 관광까지 "변소 밑에서 삽 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 <북한내부>갑작스러운 '10배 임금 인상'은 어떻게 됐나? (1) 확대하는 디지털 통화와 카드 결제 "정전 잦은 게 문제
- <북한내부>대낮에 복면강도 사건 잇따라 젊은 층에 의한 조직적 범행 다발 치안 악화에 긴장하는 당국 함북 회령
- <북한내부>김정은 "간부가 접대 받는 것은 특대형 범죄 행위" 강력 비판, 혜산에서 간부접대용 '골방' 폐쇄 주민 반응은 냉담
- <북한내부>물가 폭등 대책으로 임시 금권 '돈표' 대량 발행 '정부 못 믿어' 빠르게 가치 폭락 수취 거부도